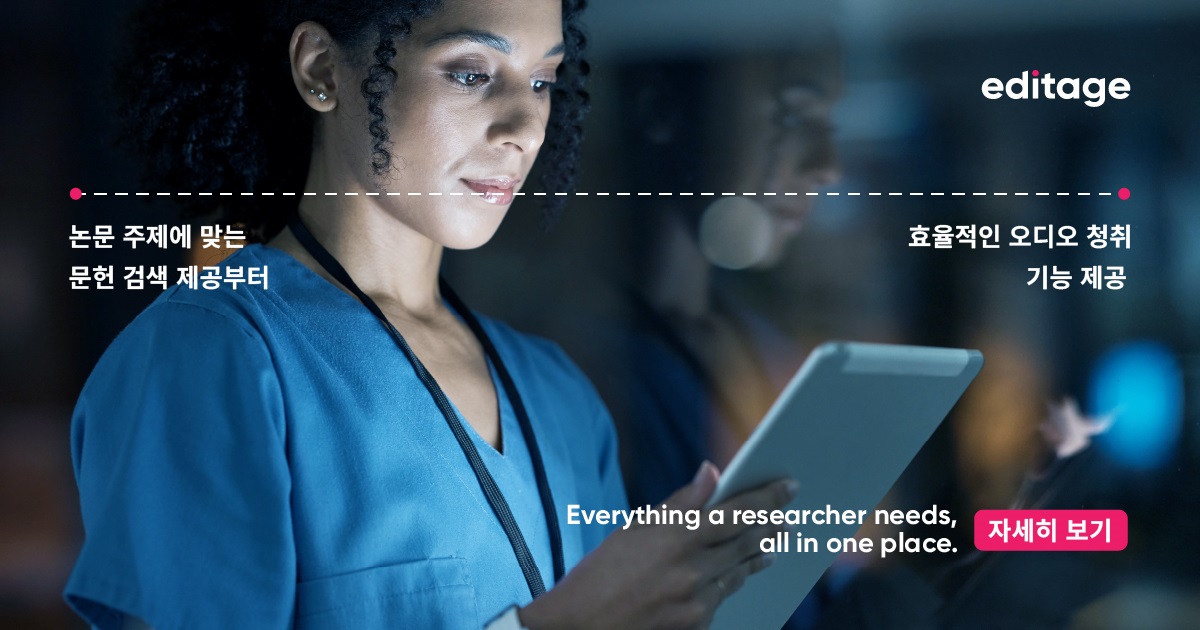편집 노트: 이 글은 저자의 블로그 초록으로 본 세상에 실렸던 글을 저자의 허락을 받고 재발행하였습니다.
내가 속한 실험실 그룹리더 J님은 영국 토박이시다. 웃음 포인트를 잘 모르겠는 유머를 구사하시는 게 특기다. 분명히 야심차게 준비한 유머라는 걸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는데 왜 웃긴 건지는 잘 모르겠다.
영국과 스웨덴의 8강전이 치러지기 전날, 회식이 있었다. 옆에 앉은 나에게 J님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예전에 말이야, 우리가 스웨덴하고 경기를 치른 적이 있어. 그 때 2대1으로 졌지. 그런데 다음 날 신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떴어. ‘Swedes 2 Turnips 1.’ 내일도 비슷한 제목이 뜨겠지? ‘Swedes to Turnips 2!’ 하하하하.”
Swede나 turnip은 모두 무의 일종이다. 나는 아직 먹어보지를 않아서 구분하지는 못 한다. Swede는 스웨덴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비유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국을 왜 turnip이라 표현한 걸까. 무보다는 당근이랑 비슷해 보이는 parsnip을 갖다 붙여도 똑같이 웃길까. 아니 애초에 이게 왜 웃긴걸까?
이런 유머와 함께 비유를 무척 좋아하는 J님과는 늘상 이런 대화가 오고간다. 나의 첫 랩미팅 시간에는 내가 하려는 실험에 대한 본인의 가설을 설명하면서 ‘daisy chain’이란 이야기를 했다. 데이지는 꽃인데 꽃 말고 다른 뜻이 있나, 사전을 들여다 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대화가 끝나버렸다. 손을 빙글빙글 돌리는 걸로 보아 둥그런 무엇이려나 하는 어렴풋한 짐작만 할 수 있었다. 한 달 쯤 후, 실험실 대학원생이 나를 위해 직접 ‘daisy chain’을 만들어줬다. 데이지를 이어 만든 왕관이었다. 데이지도 안 나는 동네에서 살다 온 나로서는 알아 듣지 못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

[이미지 출처] 블로그 초록으로 그린 세상
그런데 여기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제법 잘 통해서 자신감이 마구 생겼는데, 요즘에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로 가다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런 때면 찾아오는 잠깐의 침묵을 견디지 못 해 ‘아무 말’이 튀어나오는 빈도도 늘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해열제가 생각이 안 나 ‘fever down medicine’이라고 해버렸다. 이런 단어야 배우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실험을 하면서 생각한 결과를 설명하는 게 힘들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의 실험 결과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영어로 설명하려 하면 자꾸 일부분이 누락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표 자료에 글씨만 늘어나는 중이다.
그러던 차에 이곳 연구실에 계셨던 한국인 교수님이 오셨다. 실험실에서는 전설 같은 존재로, 대학원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준 바 있다. 바로 개인 면담 시간을 잡았다. 발표 자료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결과들이 변변치 않아서 참 초라해 보였다. 잘 설명하고 많이 여쭤봐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종일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그리고 찾아온 면담 시간. 조심스레 시작한 발표는 그림에도 없는 내용까지 부연설명을 하며 쏜살같이 지나갔다.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처음 실험을 할 때 예상 결과와 다르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다양한 결론, 그리고 그 결론을 다듬어서 세운 새로운 가설과 실험들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다. 하지만 오히려 교수님과의 대화 이후, 이 실험을 마치면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이 좋을지,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가 큰 물음표로 남았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같은 학문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새로운 발견을 모두가 즉시 공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논문이 아닌 각종 아카이브에 논문 혹은 논문의 일부를 올리며 실시간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단일 언어는 더욱 필요하다. 과학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더욱 진일보하는 학문이기에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은 또다른 언어라는 여과 장치 없이 바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한 바 없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내 영어 실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초등학교를 외국에서 다니면서 배운 영어를 잘 유지해 왔지만, 그 사이 실력이 더 향상되지는 못 한 것이다. 그렇기에 실험처럼 변수가 많고 그만큼 해석의 여지도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실험실 동료들과는 친해진 만큼 더 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게 지금의 어휘력으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어제만 해도 실험실 언니와 출산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때의 충격과 공포를 영어로 표현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매일매일의 소소한 이야기들은 더 많이 말을 하며 키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실험을 하며 느끼는 부족함은 단순히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교수님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알 수 없는 갈증이 계속 느껴졌기 때문이다. 무엇이 부족한걸까?